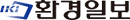[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비롯해 올초에도 각종 화학물질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안전 위주가 아닌 업계 편의 위주로 관계 법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보이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위해’라는 것이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업체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보상을 염두에 둬야 하고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 뻔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다 사고가 커졌을 때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IMF 이후로 한국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은 두말할 여지 없는 절대 가치며 도깨비방망이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화학물질 조금 썼다고 시비를 걸면 특히 중소업체의 타격이 심하다며 ‘환경’ 따위는 후순위로 밀린다.
그 결과 대기업들은 매년 순이익 규모를 갱신하고 계열사를 늘려 ‘대기업 빵집’ 논란까지 일으킬 정도지만 일반 국민의 벌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나라의 빚은 3배 늘었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끌어올린 글로벌 경쟁력의 과실은 대체 누구에게 돌아간 것인지 명확하다.
환경은 국가 전체의 재산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빚이다.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핑계로 이를 모두 탕진해버린다면 망가진 환경에서 살아야 할 다음 세대가 과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까?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도 일부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가 전체의 재산을 희생해야 할 이유는 없다. 내가 사는 지역의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내가 마시는 공기마저 오염시키고 나의 건강을 희생하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
mindaddy@hkbs.co.kr